谷神不死
불사선 불사악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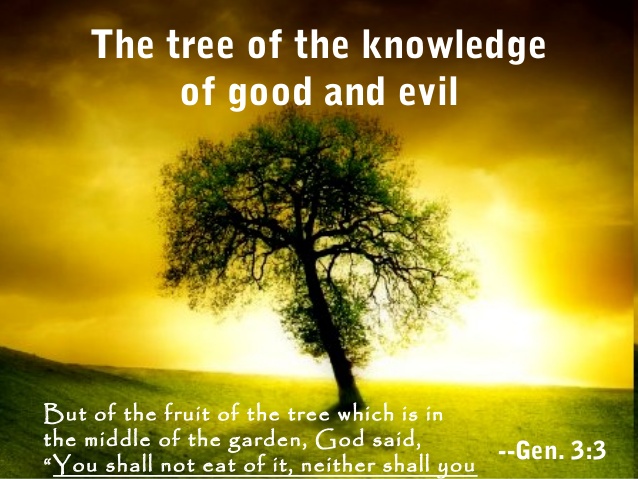
지식(知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책 많이 읽은 것으로 우쭐하는 사람들 말이다.
특히 신앙에 매몰되어 교리를 금과옥조로 따라는 사람일수록 과대망상(誇大妄想)이 강하다.
대체로 크게 깨달은 사람일수록 학벌이 약하고, 읽은 것이 적은 사람이다.
혜능(慧能)이 말했다는 '불사선(不思善) 불사악(不思惡)'은 그 초점이 선(善)이나 악(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에 있다.
깨달음을 구하려면 무념무상(無念無想), 즉 일체의 상념을 없이 해야 한다. 그리하려면 머릿속에 든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불리하다.
내가 신앙(信仰)을 가진자는 깨닫기가 어렵다고 한 것은 신앙인은 자기의 신앙을 고수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자기 신앙을 추앙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다.
'불사선(不思善) 불사악(不思惡)'은 몰지각한 승려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을 가벼이 보거나, 악을 묵인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며, 이편도 저편도 들지 말라는 의미는 더욱 아니다.
그것은 선(善)한 마음도 없고, 악(惡)한 마음도 없는, 그야말로 선악이 없는 마음, 본래의 자리 진면목(眞面目)을 말하는 것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면, 선과 악이라는 분별과 차별로 나타난 현상 이전의 상태, 즉 인식이 생기기 전의 상태로 보라는 것으로, 가장 적극적이고 완벽한 진리의 가르침이다.
우리는 인식한 대상을 선과 악으로, 또는 사랑과 미움 등등 갖가지로 분별하고 집착하는 습성을 가졌지만, 그것들을 단박에 버리고, 초월하여 나가는 절대적이고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라는 것이다.
죽은 성철(性撤) 스님은 수행자가 책을 읽는 것을 극구 금지했다고 한다. 그것이 분별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은 깨달음을 방해한다.
이 '불사선(不思善) 불사악(不思惡)'을 우리네 삶 속에 가져오면, 일상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시비와 다툼을 끝내고, 늘 여여(如如)하게 고요함 속에 머무를 수가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각종 정신질환을 일으키며, 심할 경우 사람을 죽이거나, 자살을 하게 하는 등, 충동을 일으키는 것이 원인이 선악(善惡)에 대한 분별과 고집이 원인이며,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이다.
불사선(不思善) 불사악(不思惡)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트레스 자체가 실체가 없는 분별과 집착이 만들어놓은 허상임을 깨달아, 그 즉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서, 거짓과 꾸밈이 없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는 신묘한 법이며 약이다.
마치 비바람이 멎은 하늘에서 새들이 자유롭게 날듯, 맑은 강물에서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유영(遊泳)하면서 물맛을 즐기듯, 소치는 아이가 소 등에 올라앉아 즐거이 피리를 불며 집으로 돌아가듯, 그렇게 스스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스트레스가 없는 삶을 영위하며,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는 솔루션이다.
애욕(愛慾)이든, 물욕(物慾)이든, 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처음 나타난 현상에 대하여 또는 외적인 대상에 대하여 무엇이라는 인식을 하고, 다시 그것을 분별하고, 분별을 통해 고착돼 버린 허상에 집착하면서, 고통스럽게 살다 죽는 것이 우리네 사람들이다.
그래서 글을 배운 바 없는 혜능(慧能: 638~713) 대사는 자신을 죽이고 스승이 전한 의발(衣鉢)을 빼앗으려 뒤쫓아 왔다가 참회하며 법을 구하는 혜명(慧命)에게, 모든 연분(緣分)을 버리고 모든 생각을 끊고 듣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불사선(不思善) 불사악(不思惡), 선(善)도 생각하지 않고 악(惡)도 생각하지 않는 그대의 참모습은 무엇이냐?"라고 물으며, 맑고 청정한 마음으로 외적인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 것을 가르쳐 준 것이다.
'달과 손가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마음을 항복 받는다? (0) | 2024.03.05 |
|---|---|
| 자력수행과 타력수행 (0) | 2024.02.23 |
| 언하대오(言下大悟) (1) | 2024.02.19 |
| 무명이란 무엇인가? (1) | 2024.02.08 |
| 일원론과 이원론 (1) | 2024.01.27 |





